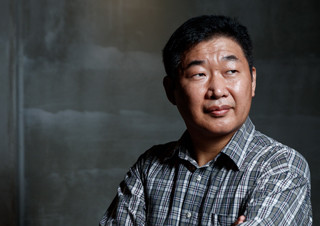사랑만큼 쉽고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너와 내가 기쁘게 만나는 일이 사랑이라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 불가능해질 때, 우리는 무거운 질문과 맞닥뜨린다. 왜 너의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다정함을 주고받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까.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일이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이 될까.
사랑의 막막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나이트 사커』의 세계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막 도착한 젊은 시인의 첫 시집을 두고, 황인찬 시인은 “사랑이 끝났다고 집요하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사랑의 불가능을 파괴하려 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사랑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시라니. 저절로 마음이 열렸다.
시집을 처음 펼쳤을 때, 눈길을 끈 것은 시인의 이력이었다. 흔한 미사여구없이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단 한 줄의 문장. 그는 이전에 시를 발표한 적 없이, 이번 시집으로 처음 독자를 만나는 신예다. 그럼에도 44편의 시에서는 오래 시를 써온 사람의 태도가 읽혔다. 겨울 오후, 아침달 서점에서 김선오 시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었다. 시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고.
“처음 시를 쓴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집을 읽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꼈어요. ‘해방의 언어’를 만난 기분이었고, 다음날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미래파 시라는 건 뒤늦게 알았죠.”
시작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 시를 쓰지 않는 기간도 길었다. 오히려 그는 한때 시인이 절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음악이나 그림이 예술에 더 가까워 보여서 시를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시로 돌아왔다고.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에 출근하며 시를 쓰고, 퇴근 후 이어 쓰다가 잠드는 날도 많았다. 결국, 시 쓰는 일이 가장 재미있어 시인이 됐다.

『나이트 사커』는 낯선 사랑시로 가득한 시집이다. 시를 읽다 보면, 이건 분명 사랑인데 사랑하는 대상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 속에서 사랑하는 ‘너’의 얼굴은 너무도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흔들린다. 윤곽이 없거나 빛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이 유령 같은 얼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너’가 이토록 불확실함을 시인은 시를 쓰면서 의식했다고 한다.
“어떤 사랑은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저는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사회적인 위치나 정체성이 결정되는 일을 자주 겪었어요. 관계가 상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늘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 시에서 흐릿하고 위태롭게 표현된 게 아닐까요.”
사랑을 위협으로 만드는 사회는 제대로 된 곳일까? 사랑이 너무도 소중할수록, 그 사람에게 세계는 더없이 폭력적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이트 사커』에는 어둠과 죽음이 곳곳에 배어 있다.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세계가 낯설어 보일수록, 화자의 눈에 은페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걸 가리는 건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말’이다.
“사회에는 많은 폭력이 은폐되어 있죠. 그리고 은폐하는 주체가 때로는 언어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고기’라는 단어에는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이 지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시 쓰기 밖에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언어는 너무나 불확정적이고 많은 것을 유실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열망 때문에 시를 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에서 열린 낭독회에서 그는 이수명 시인의 “시 쓰기는 영원한 휴식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 세계의 질서가 무겁고 숨 막히는데 시 쓰기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존의 밑바닥으로 가장 강력히 뛰어내릴 수 있게 한다고. 그러한 즐거움이 계속 시를 쓰게 만드는 것 같다고.
자유를 꿈꾸는 시인의 의지 때문인지, 『나이트 사커』의 세계에는 어둠과 강한 빛이 공존한다. 시집을 펼 때는 짙은 남색의 표지처럼 어둠을 만나게 되지만, 덮을 때쯤이면 눈부시다는 인상이 남는다. 이 빛에 대해 묻자 시인은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지금도 자주 떠올리는,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자연은 정말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다에서 엄청난 크기의 검은 파도가 몰려오는 장면을 보고는 문득 죽음 직전의 감각은 이렇겠구나 했죠. 최근에 명상하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죽음을 떠올리는 이유는 결국 삶에 애정이 있어서구나. 나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시적 순간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를 짓누르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도 빛의 아름다움은 존재하고, 사랑하던 순간들은 남는다. 그 기록이 『나이트 사커』라는 한 권의 시집이 아닐까. 인터뷰가 끝나고 시집을 덮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그 빛이 마음에 남았다. 여전히 너는 어느 쪽이냐 묻고 사랑은 자꾸만 부정되지만, 그럼에도 기억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너’는 흔들리고 사라져가도 “옆얼굴이 빛으로 붉게 물들어도/잊지 않을게”(「야간 비행」)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이트 사커』를 경유하여 발견한 새로운 사랑의 세계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