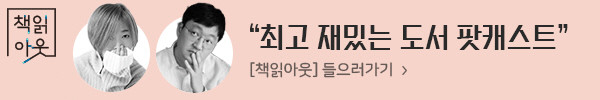“모자람은 꽤 괜찮은 친구다.”정지음 작가는 세상은 양쪽으로 봐야 좀 더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실수투성이 자신을 “뭐 어때요”하며 웃어넘기고, 슬픔을 뒤집고 뒤집다 유쾌함에 도달한다. 『젊은 ADHD의 슬픔』은 스물여섯 살에 ADHD 진단을 받은 젊은 직장인이 기울어진 일상을 울고 웃으며 지나온 기록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회색으로 오해되는 ADHD인의 일상은 정지음표 유머를 만나 통통 튀며 공감으로 나아간다. ‘ADHD의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는 독자 후기가 이어지는 이유다.
작가는 ADHD 진단을 받은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화창한 날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는데, 홀로 길 위에 주저앉았다. 살면서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정상인’의 범주에서 내쳐진 기분이 들었고, 개성이라 믿었던 모든 특성이 정신질환에 종속되는 것 같았다. 낮에는 ADHD의 증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실수를 수습해야 했고, 밤이면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치열했던 학창시절, 빨리 진단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후회도 됐다.
질환을 껴안고 고통스럽게 자신을 인정하는 시기를 보내며 작가는 생각했다. ADHD를 갖고 태어난 나도 좀더 상냥하고 재미있게 표현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시작은 단순했다.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려고 어플을 켜서 무작정 쓴 글에 많은 독자들이 응원을 보냈고 브런치북 대상을 받았다. 책 출간을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쓴 건, ADHD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신질환이 미화되는 것을 경계했어요. ADHD가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면, 환자들의 진짜 고통이 지워지는 셈이 되니까요.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도 ADHD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만 조명을 받으면, 다른 ADHD인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못 하니’ 하는 말이 돌아와요. 저는 오히려 부족함이 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ADHD인이 겪는 어려움이 먼저 알려져야 가능성을 봐주는 태도도 생길 테니까요.”
가볍게 시작한 글쓰기였지만, 쓰면서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글을 쓰기 전에는 누군가가 읽어줘야 의미가 생긴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를 위해 쓰는 것이더라고요.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은 강한 자기고백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억압이 강할수록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지니까요. 그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글로 쓰면 적어도 나 자신은 무한한 공감을 보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독자는 나니까 한 사람의 인정은 얻은 거죠.”
ADHD는 유독 오해가 많은 질환 중 하나다. 주변에 증상을 알리면, “나도 ADHD 같아”라는 반응이 돌아올 때도 많다. ADHD의 증상 자체가 먹고 자고 입는 일 등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에 대입하고 “혹시 나도?”하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심각성이 무시되고는 한다.
“가장 흔히 받는 오해는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 받는다는 기분이 들죠. 또, ‘너 약 먹었어?’라는 말이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 많은 ADHD인들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을 생각도 해요. 그런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무척 속상하거든요. 약을 먹지 않은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ADHD인에게 필요한 건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면 한쪽이 지치기 쉽잖아요. ADHD인과 비ADHD인 모두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취약한 면이 보이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맡는다거나, 그 사람이 자신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건 ADHD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예요.”

작가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독자들이 ADHD에 대해 새롭게 알았다는 후기를 보내올 때. “이 책이 찬사를 받기보다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ADHD는 성인 발병률이 약 4%나 되는데도 구체적인 어려움은 잘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오해가 풀리고 논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ADHD를 전혀 몰랐던 분이나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도 제 책을 잘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딸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후기였어요. 정말 넓고 깊은 긍정이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곤 해요.”
인터뷰 내내, 정지음 작가는 우리가 부정적이라 믿어온 말을 자주 뒤집었다.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돌파구가 됐고, ‘완전히 지는 것’을 받아들이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다고. 슬픔과 비관을 뒤집고 뒤집는다고 깨끗한 긍정으로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 고통이 둥글어진다.
추천기사